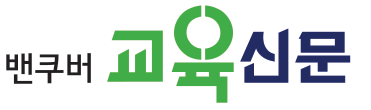밴쿠버에 살면서 사람들은 종종 한인사회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 받고 관계가 소홀해지곤 한다. 그만큼 소통의 의미를 중요하다. 이웃이나 친구 등의 인간관계부터 직업이나 비지니스 간의 관계까지 대화의 기술은 여전히 관심거리일 것이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리더들을 가르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빌 맥고완이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는 어떻게 공감을 얻는가’ 를 통해 대화하기 불편한 4가지 유형의 사람을 소개했다. 당신은 이 유형이 아닌지….
했던 말을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는 사람
글을 쓰는 기자나 작가들은 교육하다 보면 상당수가 마치 글을 쓰듯 말을 해서 놀랄 때가 종종 있다. 글을 쓰는 사람은 문장을 만들고 읽고 지우고 또 쓴다. 앞에 썼던 것보다 더 좋은 문장이 떠오르면 기존의 문장을 지우고 다시 고친다. 글을 쓸 대는 더없이 좋은 자세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했던 말을 고치고 또 고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북 캘리포니아인 것 같네요.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운전을 한 개 아니라 탑승을 하고 있었죠. 운전은 제 친구가 했고요. 어쨌든 우리는 컨퍼런스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니 컨퍼런스라기보다는 일종의 모임이었죠….”
말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지우고 앞으로 돌아간다. 당연히 듣는 사람은 지루해지고 커뮤니케이션은 흐르는 물이 큰 바위를 만난 것처럼 정체되고 만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가장 먼저 했던 말이 가장 나은 경우가 많다. 중요한 정보에 집중하랴, 덜 중요한 정보는 100퍼센트 정확하게 교정하고 싶은 충동이 들더라도 그냥 참아라.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이 대단한 발명품을 가지고 고객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보다는 자신이 그 제품을 만들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집착한다. 소비자는 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제품이 어떻게 자신의 생활을 바꿀 것인지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다.
설명이 지나치게 상세한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은 핵심만 빨리 짚어주고 이야기를 진행하기보다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한다. 교사나 교수 등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주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똑똑한 학생들 앞에서 50분 이상 혼자서 떠들어야한다. 간혹 토론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수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다. 50분을 혼자서 채우는 시간이기에 강단은 간결함을 연습하기에 그리 좋은 장소가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저 강의 시간을 채우는 데만 급급해하는 교수들도 있다. 교수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핵심을 강조한다. 이런 방법이 학교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학교 밖의 세계에서는 이상적이지 않다. 간결하게 줄여라 반복하지 말고 그냥 핵심을 말하라.
클리셰*를 남발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클리세를 남용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선수들은 거의 전적으로 클리세에 의존하는 것 같다. 어디서 배웠는지는 몰라도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30~40초를 넘기지 말아야하고 그 안에는 반드시 클리셰가 들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영화 ‘19번째 남자’에서 전배 포스는 메이저리그로 진출에 언론과 인터뷰를 해야하는 한 후배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클리셰를 배워야 할 거야. 글리셰를 공부하고 그 의미를 알아야하지 클리셰는 네 친구야. 받아 적어, 하루에 한 가지씩 클리셰를 인용하는 운동 선수도 있다. 뉴욕 양키스의 커디스 그랜더슨이 바로 그렇다. 최근 팀에서 부상 사고가 전염병처럼 확산되자 그랜더슨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이 부두인형(부두교에서 주슬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인형)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찾아서 찌르고 찢어야 합니다”
* ‘클리셰’는 진부한 표현이나 뻔한 캐릭터와 스토리, 즉 고정관념을 뜻하는 프랑스어다.